[AP신문=이하연·권이민수 기자]

김동욱 : 그래서 설명이나 매뉴얼이 친절하진 않아요. 기능도 최소화의 기능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페이스북 광고를 기본적으로 세팅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한정돼있죠.
저희가 광고를 세팅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광고를 세팅하는 영역은 광고주가 직접 해야 해요. 저희 트리거 시스템은 세팅된 광고를 껐다 켰다 하는 것뿐이죠.
5. 런칭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편인가요?
김동욱 : 사실 런칭 전에 저희 쇼핑 광고주 중 하나가 이걸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베타로 제안을 했는데 그분은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트리거 서비스에 관해 물어보는 곳은 많지만, 아직 쓰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기사가 나가면 모르겠죠. (큰 웃음) 저에게 (이하연 기자가) 빨리 연락을 주셨어요.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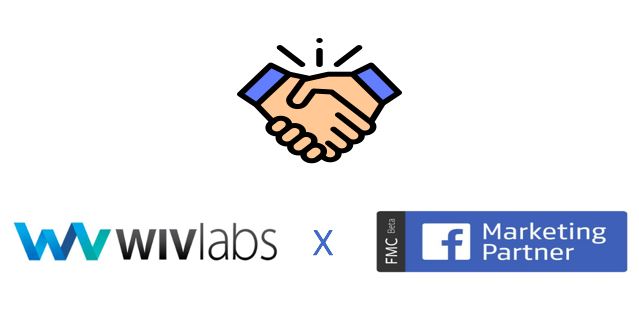
김동욱 : 페이스북 마케팅 파트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그 중 애드 테크 파트너, 즉 기술 파트너예요. 페이스북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제삼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파트너죠. 저희 다음으론 아직 애드 테크 파트너가 없을 거예요.
작년 7월부터 파트너가 되면서 API Call(트래픽) 수가 무제한이 됐어요.
(여기서 잠깐! '트래픽 수가 무제한'이라는 말이 뭘까요? 예를 들면 지도 서비스를 우리 홈페이지에 탑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지도 서비스를 콜(호출)할 수 있는 횟수는 정해져 있어요. 10만 번 이런 식으로. 그 이상 되면 요금이 추가로 부과돼요. 하지만 트래픽 수가 무제한이라면 그 이상으로 추가 요금이 붙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쇼핑을 위한 도구들을 몇 달 동안 자유롭게 만들어 왔어요. 근데 아직 외부에 런칭은 안 하고 묵혀두고 있는 상태예요.

김동욱 : 사실 공식적으로는 다음주(1/10 인터뷰 기준)에 회사 사람들과 함께 워크숍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잘하는 것을 잘하는 한 해를 만들자'예요. (웃음)
그전에는 잘 못 하는 분야도 잘하자는 부담감 때문에 좀 힘든 점이 있었어요.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했었다면 더 많은 성과를 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홍병훈 : 앞서 대표님의 이야기('잘하는 것을 잘하는 한 해를 만들자')를 좀 더 인문학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디지털 광고대행사들, 랩 사들은 아침에 정말 바빠요.
어제의 광고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고 광고를 세팅하는 일들로 하루의 일과 대부분을 보내게 돼요. 그런 일들을 굳이 사람이 해야 하나 싶어요. 감성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기계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일들은 기계가 하자. 그래서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자. 이 부분이 위브랩이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요. (웃음)

김동욱 : 저희는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저희 또한 저희가 만든 도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말고도 다른 대행사들이나 광고주들이 어떻게 그 도구를 쓰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트리거를 포함한 저희의 도구들이 많이 쓰이면 좋겠어요.
또한 저희가 아직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텐데 (어느 누구든) 그런 아이디어들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저희가 고객을 위해서 도구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웃음)
홍병훈 : 광고 회사 안에 있는 마케터들은 되게 부지런해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시간으로 광고의 효율이 나오는데 그 효율을 판단해 더 좋은 효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더 게을러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학교 졸업까지 했는데 왜 Ctrl+c, Ctrl+v 같은 삶을 사나' 한탄도 좀 해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저희의 도구를 가지고 게으를 수 있는 실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러한 도구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B컷 질문 ◀
페이스북, 인스타 등 점점 커지고 있는 SNS 광고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욱 : 당연한 이야기지만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SNS가 새로 생긴 매체다보니 대기업의 예산이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광고 지면에 대한 공급은 많은데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SNS를 광고판으로 썼던 곳들이 좋은 효율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도 언제까지나 효율을 얻을 순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TV 광고든 일반적인 인터넷 포털 배너 광고든 효율의 균형이 맞춰져 갈 거라고 생각해요.
홍병훈 : 1990년대 후반에 나온 싸이월드의 카피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좋은 세상' 그런 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SNS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서로의 일상을 궁금해하는 것으로 시작된 거죠. 프리첼(커뮤니티), 다음 카페 등을 지나 페이스북, 유튜브로 변화된 거예요.
내 친구들을 궁금해하고 그들을 연결해주는 작업은 어떻게든 이루어질 거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천년만년 가진 않겠죠. 또 지나면 다른 어떤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SNS라는 개념은 아마 계속 갈 거라 생각해요. 'SNS'라는 이름도 바뀔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모이는 곳은 계속 있을 거예요. 당연히 브랜드들은 그런 곳에 광고를 노출하고 성과를 얻고 싶을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건 사실 페이스북이랑 구글이 들어오면서 시장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API라는 것을 제공해요. 쉽게 말해, 광고를 좀 더 쉽게 하게 해준다거나 운영의 틀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거죠.
그에 반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매체들은 아직은 준비 단계에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준비단계에만 있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광고하게끔 플랫폼을 구축해주지 않을까요? 그러한 플랫폼을 통해 업체들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